6. 팝레코드하우스 3기
모교에서는 매년 축제 때
따이빙 굴비 라는 학내 밴드들 경연대회를 해서
상위권 팀들은 축제 본 무대에 올려준다.
2006년 데 군과의 다소 말랑했던 팝레는
전체 2위였나를 했고
축제 본 무대에는 학내 마지막 팀으로 섰던 것 같다.
우리 다음이 초대 밴드인 넬 이었고
브로콜리 너마저는 저 앞에 낮에 했었다.
(물론 이미 홍대에선 초인기 그룹이었지만)
2007년에는 그럼 얼마나 자신이 있었을까.
잠들기전에 로 예선에 나갔던 기억인데
이 군과 나의 일렉 두 대의 음압이 엄청났고
그 결과 보기 좋게 탈락해버린다.
그리고 언젠가 되게 중요한 클럽 토요일 공연을 했는데
클럽 공연은 사람이 제일 적은 화요일에 데뷔를 해서
수 목 일요일을 거쳐 금 혹은 토요일 밴드가 된다.
이 과정은 짧을 수도 있지만
밴드가 성장을 못하면 영영 안될 수도 있다.
그리고 토요일 고정이면 클럽의 메인 팀이 되는거다.
근데 일렉으로 역시 대차게 말아먹는다.
(일렉을 들면 종종 욕심이 들어간다)
이 즈음 일렉 위주의 밴드 사운드에 회의감이 들었고
어쿠스틱이 중심을 잡는 밴드로 변하고 싶었다.
모티브는 Travis, Mr.Children, Coldplay 정도였다.
그리고 이 군이 나간 자리에
다이빙 굴비에서 눈여겨 봤던
전기과 밴드를 하고 있던 학과 후배인
김 군을 영입하게 되고
박 형의 자리에는 마찬가지로 그 밴드였던
강 군을 영입하게 된다.
그렇게 팝레의 나름 인정을 조금 받게되는
음악적 스타일이 확립되는 멤버인
나, 임 형, 김 군, 강 군 의 라인업이 된다.
어쿠스틱 위주로 완전 곡을 새로 다 썼다.
빛, 피콜로 대마왕, Hello Stranger, Wake Up
You’ll never walk alone, Bye Bye
지하철역, May all your will be done
같은 곡들이 있었다.
이 때는 완전 내 낙성대 시절 감성이었다.
나는 아직도 몇 몇 곡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FF, 프리버드, 사운드홀릭, 바다비 등등
홍대 대표 클럽들로 활동 영역을 넓혀나갔다.
FF에서도 꽤 좋은 공연을 하던 팀이었고
엔지니어 정 군이 우릴 좋아해줬다.
프리버드 매니저 이 군도 우릴 좋아했었고
느낌이 딱 온다며 다소 늘어지는 것만 고치면
더 좋을거라 했다.
고고스 엔지니어들도 우리랑 친하게 지냈다.
클럽 ㅃ 사장님은 그러나 굉장히 고민하는 얼굴로
흐음.. 하.. 좋은 것도 같은데…… 라고 하며
끝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
우리는 데모를 만들어서 인디 레이블에 돌리기로 했다.
사실 데모로는 곡의 우수성만 보여주고
만듦새는 인디 레이블의 프로듀싱을 받고 싶었다.
그 와중에 레팩의 박 형이
데모도 사운드가 좋아야 먹힌다고 해서
당시 강남 어디 타운하우스에 있던
박 형 스튜디오에서 믹스 마스터를 했던 기억이다.
데모를 돌렸고 꽤 유명한 레이블에서 연락이 왔다.
아직도 활동하는 전설적인 팀들이
두세팀 정도 거쳐갔거나 소속이 되어있던 레이블이었다.
미팅을 하러 갔는데 우리가 곡 작업을 하고 있으면
모아서 음반을 내자며 프로젝트라고 불렀다.
이제 음악으로 완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마 2009년 정도였던 것 같다.
그러나 끝내 연락이 다시 오지 않았다.
내가 연락해봤지만 답이 오지 않았던 기억이다.
그냥 부사장급 담당자 한 명은 우릴 마음에 들어했지만
결국 다른 선에서 가능성 없다고 본게 아닐까 싶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 데모를 좀 더 다듬어서
우리끼리 음반을 발매하게 된다.
빛, 피콜로 대마왕, Stay 데모가 들어간
팝레의 첫 싱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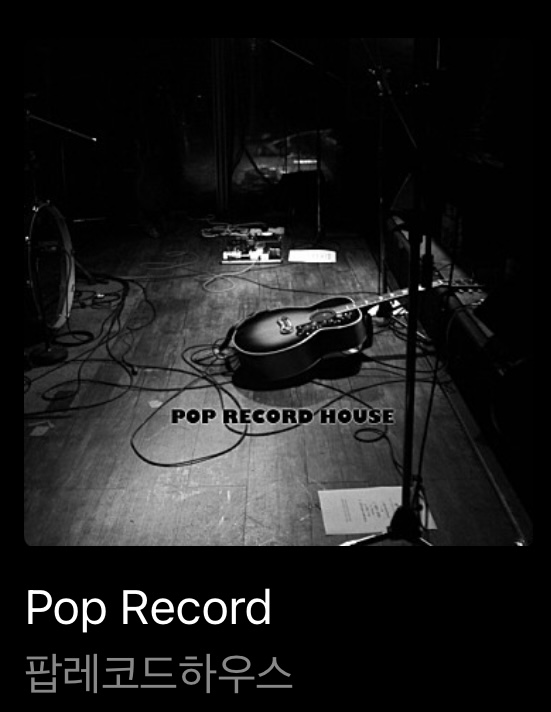
2010. 12. 10.
표지 사진도 내가 찍은 FF 무대 사진이고
폰트며 자켓이며 우리가 모두 직접 다 만들었다.
진정한 인디.. 인 것이다.
간혹 피콜로 대마왕 곡 제목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 곡의 코드진행이 우리 곡에서 여러 곡에 쓰였다.
일반적인 I-III-IV-V 버스랑 코러스에
IV-V 의 브릿지를 가진 곡이었다.
그래서 저 코드 진행 하나로 송폼을 만들어 놓은게
마치 피콜로 알 낳듯이 계속 다른 곡으로 증식한다고
별 생각없이 붙였다가 지어진 이름이다.
빛은 우리끼리는 lux 라고 불렀었다.
당시 어느 나른하고 한적한 낙성대의 일요일 오후
여유와 조급함 사이의 나 자신에 대한 곡이다.
아직도 당시 팝레 감성을 대표하는 곡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연락이 안되는 이 양이
빛이야 말로 팝레 스타일이 가장 잘 드러난다 했었다.
이 시절은 그래도 아련하게 남아있다.
깁슨 어쿠스틱 하나 들고
따뜻한 날씨에 야외에 아무데나 바닥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하나 놓고 기타를 치곤 했다.
뭐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었고
음악인으로서 존 레논부터 이어져오는
자유와 인류애를 이어간다는 사명감도 있었다.
(다음에 이어서….)
'All You Need is Music > Band & Guitar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팝레코드하우스 스토리 5 (0) | 2025.03.09 |
|---|---|
| 팝레코드하우스 스토리 4 (0) | 2025.03.09 |
| 팝레코드하우스 스토리 2 (0) | 2025.03.09 |
| 팝레코드하우스 스토리 1 (0) | 2025.03.08 |
| 남의 기타 (0) | 2025.02.28 |